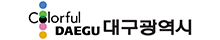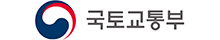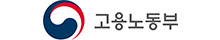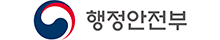판례 아파트 경리 5억 횡령, 법원 “소장에게 구상권 행사 못해” [김미란의 판례평석]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의 경위
가. A사는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회사고, B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1. 1. 15.부터 2022. 1. 31.까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C는 B의 남편이고, D는 B의 자녀다. E는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7. 4. 16.부터 2022. 7. 10.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나. B는 관리업무를 위해 개설된 입대의 명의의 통장을 관리해 보던 중 2012. 11. 16.부터 10월분 장기수선충당금 242만728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마치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2. 1. 26.까지 합계 5억6402만7588원을 횡령했다.
다. A사는 2022. 2. 17.부터 2024. 6. 11.까지 아파트 입대의에 본건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5억6458만8328원을 지급하고, B와 E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는 B가 관리사무소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5억6402만7588원을 횡령해 A사에 동액 상당 손해를 입혔으므로 A사에 불법행위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계속 중 B는 사망했고, 상속인인 C와 D가 한정승인해 위 소송을 수계했으므로 B의 상속인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사는 E역시 소장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B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잘못이 있다며 공동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라. 횡령을 저지른 경리직원의 배상책임은 당연하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C, D의 배상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 문제는 소장 E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일 것이다.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을까.
법원의 판단
가. 상속인 C, D에 대한 청구 인용
A사 역시 B의 사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B와 공동해 피해자인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A사가 이를 전액 변제함으로써 B 역시 공동 면책됐으므로 B는 A사에 구상금 5억6402만7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가 사망했고, C와 D가 한정 승인했으므로 B의 A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역시 C, D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비율에 따라 계산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사무소장 E에 대한 청구 기각
A사는 B의 사용자고, E는 A사에 갈음해 아파트 소장으로서 B를 감독하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이 정한 대리감독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대리감독자에게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민법 제756조 제2항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사용자가 아무 제한 없이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중간의 대리 감독자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리감독자에게 행위자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고의 또는 이와 동일하게 볼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런 경우 일반 원칙에 따라 구상을 구하는 사용자가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가 소장이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계금잔고 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예금통장 관리와 통장 수입금 취급 및 기장 업무는 회계 담당자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며 위조 여부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범행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E가 B의 불법행위를 알아챌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입주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입주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A사와의 근로계약상 주의의무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평석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경리의 횡령 범죄는 안타깝지만 그리 낯선 범죄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는 피해를 복구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간혹 목숨을 버리는 경우까지 있으니 피해자로서는 그 책임을 어디에 어떻게 물어야 할지 난감할 수도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나 대리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이나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이 그러하다. 다만 이는 모두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그들의 피해가 최대한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김미란 변호사 hapt@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관련링크
- 이전글지하수조 넘쳐 차량 침수…“위탁사・보안업체 책임 80%”[김미란의 판례평석] 24.12.30
- 다음글“아파트 ‘2대 초과 차량’ 등록 제한 규정 유효” [김미란의 판례평석] 24.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